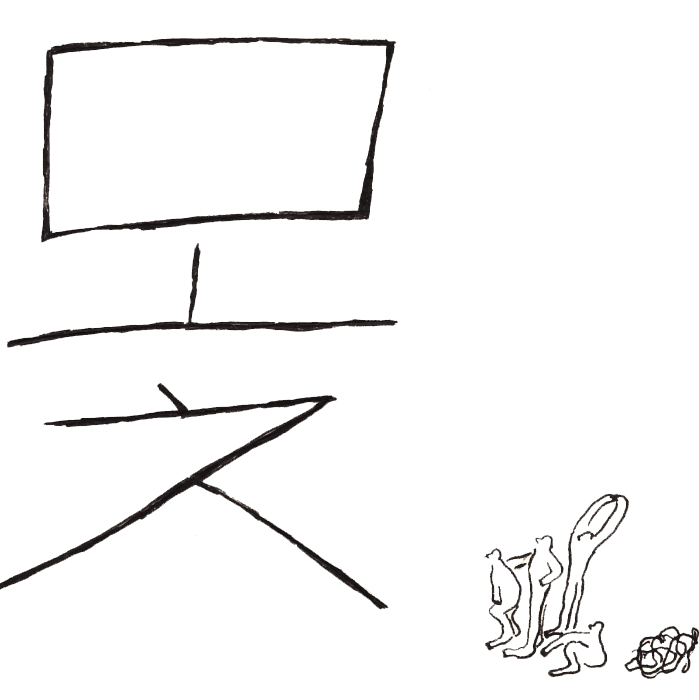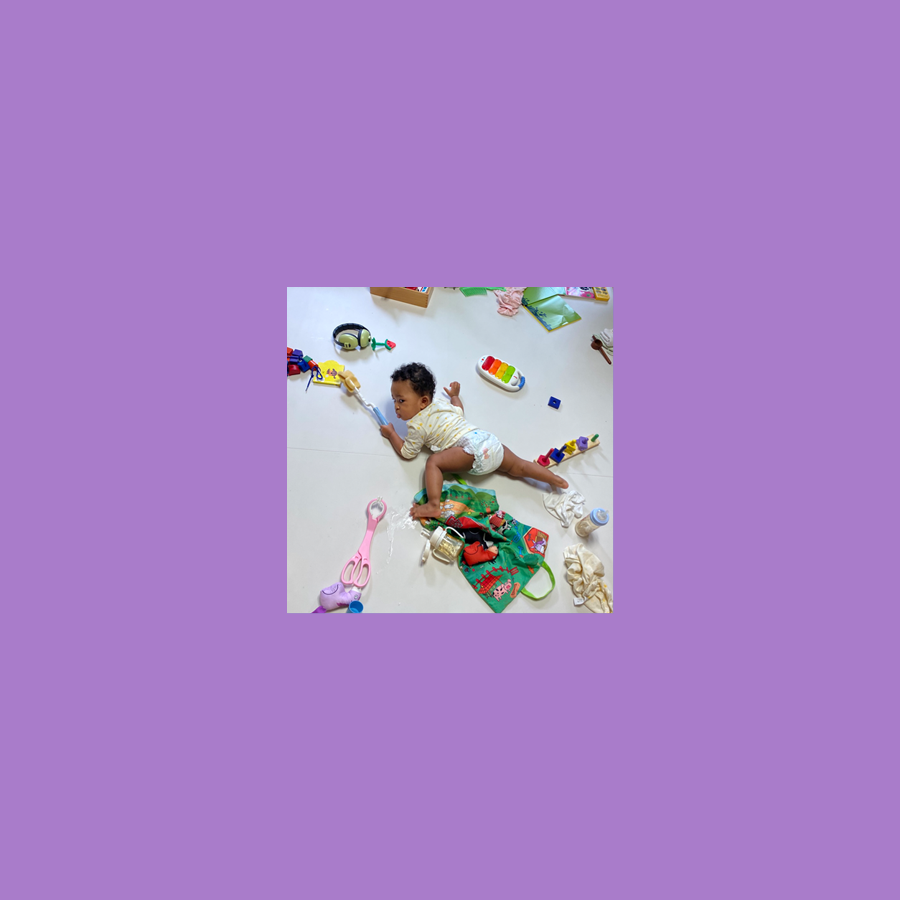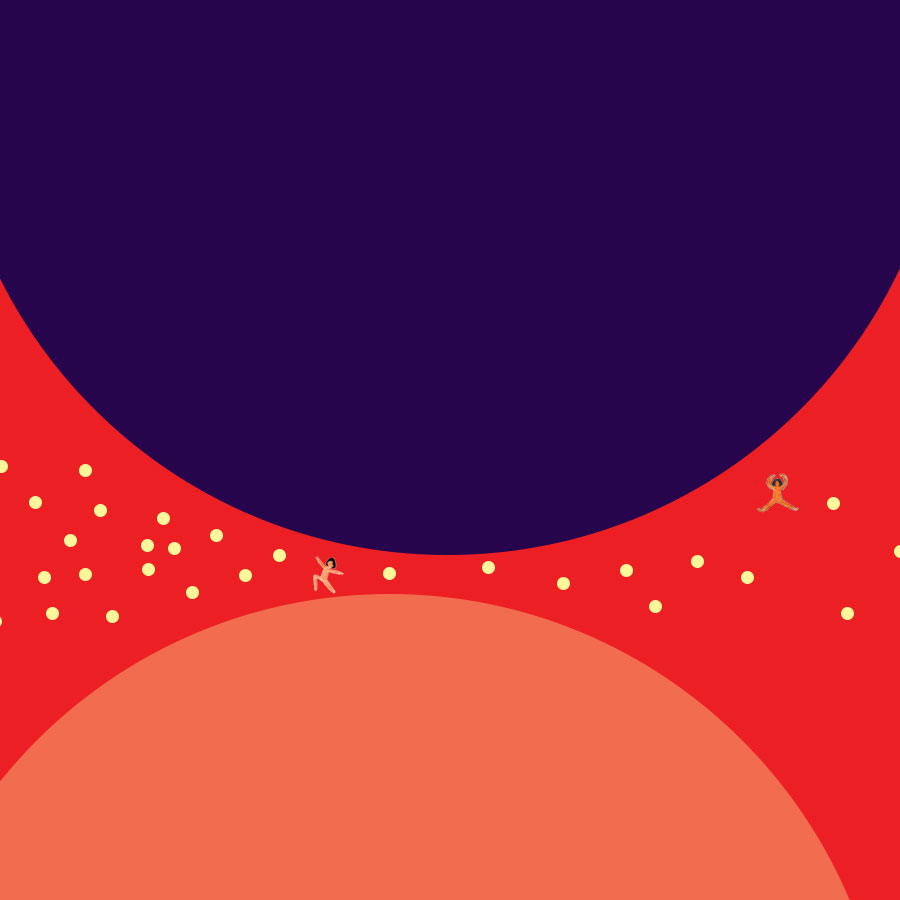
31화. 거리의 몸들- 춤추며 그러모은 문장들
가을볕이 쨍쨍하던 어느 토요일 오후, 사람들이 거리로 모였다. 도로를 점령한 몸들은 어딘가 부산스러워 보이면서도 몹시 깡깡했다. 몸과 몸들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마이크를 잡은 몸이 힘주어 건네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한국의 마지막 석탄발전소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삼척에서 온 몸, 안전한 삶을 요구하며 8년째 거리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가까이 거주하던 몸, 수라갯벌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며 군산에 새로 들어설 공항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몸, 노동하는 몸, 농사짓는 몸, 장애가 있는 몸, 아픈 몸, 평온하게 살아갈 시간이 더욱 많이 남아 있어야 할 몸. 그리고 그 몸에 쌓인 말들.
기후재난 앞에 가장 먼저 노출될 몸들이기도 했다. ‘여성이고, 빈민이며, 장애인이고, 이주민이고, 청소년이고, 노인이고, 비수도권 거주민이며, 성소수자이기도 하고, 환자이자 임차인1’을 교차하는 몸들이 한데 모였다. 공공의 공간에서 공동의 몸이자, 익명의 몸을 만들어냈다.
개인적으로는 어디선가 마주친 적 있는 몸들도 있었다. 머리를 맞대고 기후정치와 여성 정치를 고민하던 몸, 서로의 호흡에 집중하며 요가를 수련하던 몸, 밀양의 765kV 초고압 송전탑을 막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농성장을 지키던 몸, 둥글게 서서 리듬을 따라 춤추던 몸, 어깨동무하고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몸. 노동하고 활동하고 춤추고 요가를 수련하며 삶의 여러 경로에서 마주친 몸들이 놀랍게도 ‘924 기후위기행진’에 모두 모여 있었다.
몸들은 현장에서 바빴다. 행진을 이끄는 트럭 위의 몸은 마이크를 잡고 함께 외칠 구호를 선창했다. ‘모든 불평등을 끝내자!’,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먼저 외친 몸의 소리를 따라 우르르 모여 있던 몸들이 더 큰 소리를 만들어 냈다. 행진이 신호를 따라 멈추면 어떤 몸들은 트럭 가까이 다가가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췄다. 리듬과 춤을 중심으로 다른 몸들이 둥글게 모였다. 암울하고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잠시 몸과 몸이 마주한 장면을 응시하며 둠칫 두둠칫 움직이는 몸들이 있었다.
몸들은 해가 지고 어둠이 드리울 무렵까지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서성였다. 다시금 리듬이 울렸고, 남은 몸들은 지친 상태로 잠시 점령한 도로에 주저앉았다. 몇몇의 몸들은 리듬을 따라 신나게 몸을 흔들었다. 몸들이 모인 자리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리듬과 몸짓과 소리가 머물렀다. 그 자리를 기억하는 몸들이 다시금 모이는 자리는 언제가 될까? 너무 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잘 기억하며 살아가려 해도 종종 잊는다. 여럿이 함께 꿈꾸고 싶은 세계도, 홀로 곱씹게 되는 세계도, 모두 몸과 몸이 빚어내는 현재라는 것을. 익명의 다수가 모인 거리의 몸들은 제각기 달랐다. 다르기에 더욱 풍성할 수 있었고, 내가 아닌 다른 존재의 삶을 구체적으로 떠올려볼 수 있었다. 기후재난이 어떻게 또렷한 모양의 불행을 전가하고 있는가에 대해, 인간종을 넘어 다른 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 걷고 멈추고 외치고 춤추고 옆 사람과 인사하고 농담하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인간의 몸이 아닌 다른 몸을 지닌 생명체의 몸짓을 거리에서 떠올려 본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내가 속해본 적 없는 세계의 몸짓을.
모두의 몸짓이 열려있는 시공간을 상상해본다. 현재 나에게는 수요일 저녁, 지하의 스튜디오에서 왕왕 열리는 시공간이다. 모두가 모이면 둥글게 마주 보고 선다. 동그라미 모양의 시작은 이 작고 소중한 춤 커뮤니티를 처음 알게 된 2016년 이래 단 한 번도 달라진 적 없는 장면이다. 안녕, 하이, 잘 지냈어? 오랜만, 하고 입으로 몸으로 인사를 나눈다. 덥석 손을 잡거나 포옹하기도 하고, 처음 만난 몸과는 넌지시 눈빛을 교환한다. 골반과 가슴과 어깨를 들썩이며 움직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다정한 자세로 기분 좋은 에너지를 풍기며 함께 춤추는 사이가 된다. 이들과 머지않아 거리에 나가 다시 춤을 출 것이다.
1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기후정의를 위해 함께 행진하자’, 924 기후위기행진 선언문, 서울,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