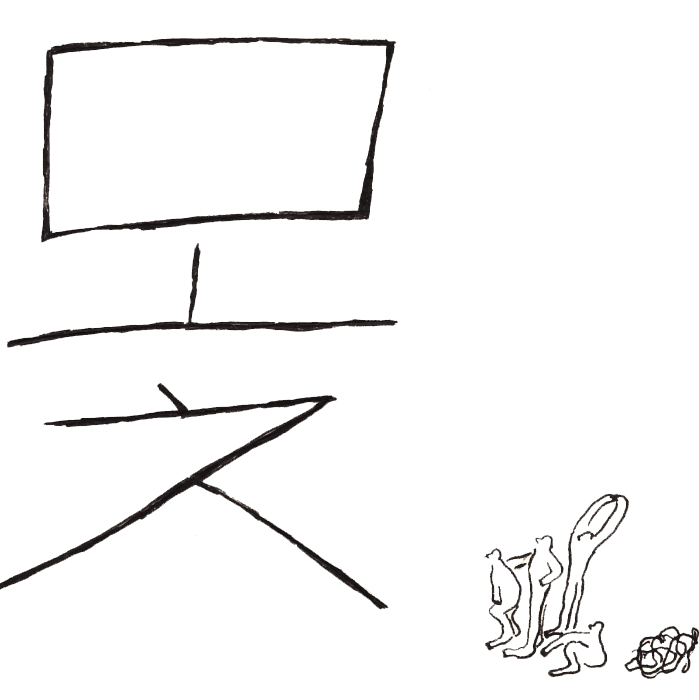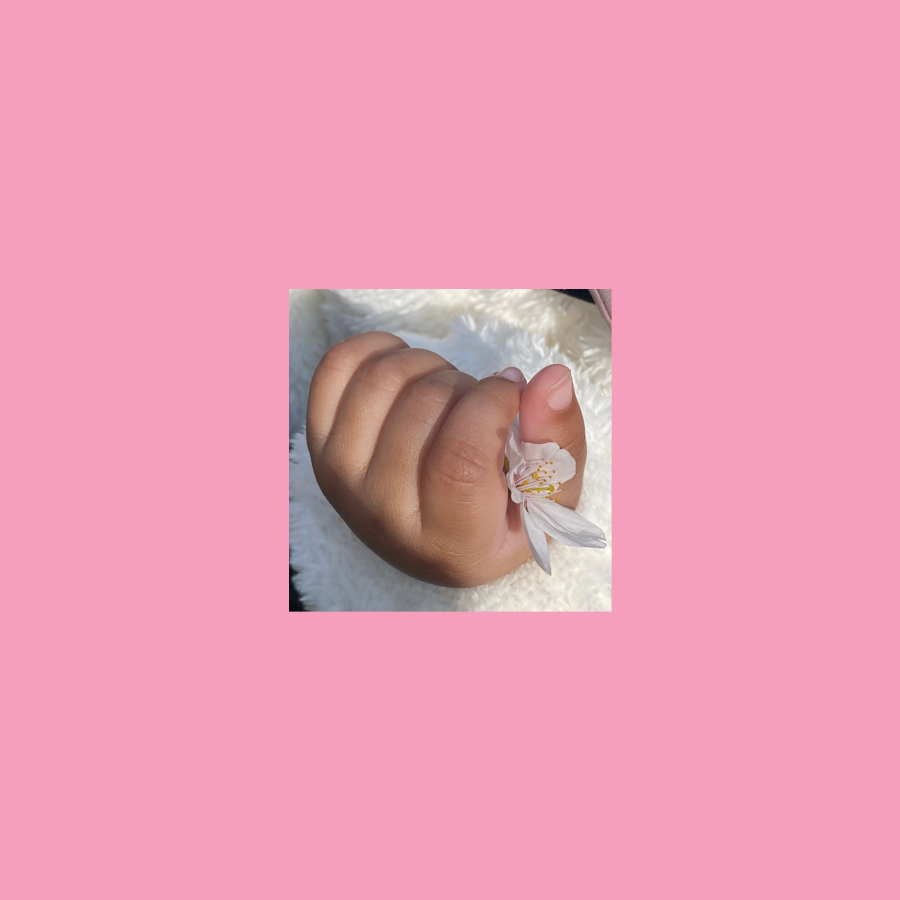2화. 리듬에 대하여
당신이 누구든 여기가 어디든
함께 만나고 춤출 수 있어
– 만딩고 문화의 ‘리듬’에 대하여
‘춤’, ‘리듬’, ‘시간’의 개념은 각 문화권마다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의 음악과 춤을 대할 때, 기존의 관념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서로 어긋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만딩고 문화의 음악과 춤에 대해 힌트를 얻을 만한 일화가 하나 있다.
도대체 첫 박이 어디죠? 누군가 한숨을 내뱉으며 질문했다. 2015년, 홍대앞 에스꼴라에서 부르키나파소 뮤지션 아미두 발라니(Amidou Balani)가 아프리카 음악 수업을 열었을 때의 일이다. 그는 퍼커션 계열의 젬베와 둔둔(dundun), 그리고 나무로 된 실로폰 계열의 악기, 발라폰(Balafon)을 함께 가르쳤다.
하나의 노래를 배우는데, 6~7종류의 악기들이 서로 다른 프레이즈(phrase, 4마디의 작은 악절)의 리듬을 연주했다. 이게 모두 하나의 음악이라는 거야? 라는 반문이 들 정도로 내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어느 정도 연주가 손과 귀에 익고, 합주를 할 때가 되었다. 모두가 함께 시작하지 않고, 언제 리듬에 들어올 지 아미두가 우리에게 직접 신호를 줬다. 처음에 킹키니(kenkini)라는 작은 북이 시작해 점점 악기들이 하나둘씩 합쳐졌다. 톱니바퀴들의 아귀가 맞으며 커다란 바퀴를 굴리듯, 따로 노는 것 같던 리듬들이 비로소 하나의 음악으로 힘차게 들리기 시작했다.
아프리카 음악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은 한국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만데 음악>이라는 책의 저자 에릭 체리(Eric Charry)에 따르면 미국에서 젬베를 배우는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라고 한다. 또한 이 질문 자체는 아프리카 음악의 관점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어원을 따라가면, 리듬은 ‘흐름(Flow)’을 뜻한다. 하지만 각 문화마다 이 흐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갖고 있다. 서구적 관점의 리듬이 시작점과 도착점이 있는 선 모양의 흐름이라면, 아프리카 만데 음악에서 리듬은 끝과 끝이 붙어있는 하나의 동그라미와 같다. 그들의 언어로는 ‘벵(Ben)’이라 부르며, 이 말은 ‘만나다, 동의하다(meet, agree)’라는 뜻이다. 동그라미로 ‘만나는’ 흐름에서는 어디서 시작하든 함께 어울릴 수 있다. 한마디로, 만나는 접점이 많은 음악이랄까. 음악을 ‘시작’하는 건, 차(Tea)를 준비할 때 물을 먼저 끓이는 이미지, 즉 “차갑게 시작하는 게 아닌, 점점 더 뜨거워지는 형상“이라고 에릭 체리는 비유했다.
이 이미지는 춤으로도 그려졌다. 2016년 부르키나파소로 여행 갔을 때 만난 결혼식, 생일, 장례식 등에서 춤들은 ‘리듬’이라는 큰 동그라미 안에서 만나 나누는 즉흥대화 같았다. 누군가 춤추기 위해 원 안에 들어오면, 뮤지션들은 그 사람에게 답하듯 연주하기 시작했다. 솔로로 춤추는 시간은 짧게는 10초, 길게는 40초 정도인데 (1분 이상 출 수 없다. 그 다음 순서에 나가려고 기회를 엿보는 이들의 아우라를 느낀다면), 그 짧은 시간에 물이 100도까지 끓어 확 넘칠 것처럼 분위기가 그야말로 불이 붙는다! 춤추는 이가 화끈한 에너지로 등장해 음악에 ‘불’붙이기도 하고, 느긋하게 춤추는 이를 갑자기 뮤지션들이 다이내믹하게 이끌기도 한다. 함께 주위를 둘러싼 채, 나도 나갈까 말까 망설이며 광경을 보고 있으면, 시간이 멈춘 듯 나도 모르게 이 리듬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만다.
결혼식과 같은 잔치에서는 인기많은 리듬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의 전통리듬이 연주되기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 이건 보보동. 저 동작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 ‘줄라사람들은 꼭 이렇게 춤추지’ 하며 가슴을 들썩거린다거나 다양한 리듬들을 친한 친구 이름 말하듯 알려줬다. 여행을 함께 간 이들 모두 쿨레칸에서 춤을 배우다 간터라, 모두들 몇가지 리듬들의 춤을 출 수 있었다. 뮤지션들이 우리가 배운 리듬을 알고, 그걸 연주해주자 우리는 모두 신이 났다. 낯선 땅에서 만난 고향 친구처럼 확 우리는 가까워졌다. 이게 무슨 리듬인지, 내가 한국인인지 부르키나파소인인지 상관없었다. ‘와, 춤은 이런 거구나.’ 아미두가 자주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두 사람이 싸웠어도 춤추면 화해할 수 있다고. 정말 그렇네, 하며 ‘위아더월드’가 되어 놀았다.
이 커다란 리듬의 동그라미 안에서 다양한 리듬들이 연주됐다. 이들은 때로는 조화를 이루고, 때로는 불협화음을 만들었다. 춤도 마찬가지였다. 리듬이 그리는 반경에서, 어떤 이는 아주 멀리 떨어졌다가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오곤 했다. 불협화음은 ‘틀린’것이 아니었다. 불협과 조화가 서로 밀고 당기면서 새로운 긴장감, 그리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만들었다. 때로는 계획된 실험으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실수, 또는 마침 그 때 떠오른 직감 등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이들의 리듬에서 느낄 수 있었다. 댄스 서클에서 춤을 출 때,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낼지 결정지으며 머릿 속으로 계속 셈을 하던 내가 떠오른다. 틀려도 괜찮았다. 또는 틀린 게 아닐 수도 있다! 분명 규칙은 존재하지만, 그들은 나에게 자유로울 수 있는 관대함을 리듬과 춤을 통해 보여줬다. 당신은 여기에 만나고, 말하고, 함께 하기 위해 왔으니까. 그게 가장 중요했다.
참고자료 : Mande Music (Eric Charry,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