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화. 첫 만남 – 보코의 춤추며 그러모은 문장들
1화. 첫 만남
나는 가끔 그림을 그리고 종종 글을 쓰고 자주 요가를 한다. 그리고 매주 춤을 춘다. 춤에 입문한 사람의 자기소개로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어느 날 문득 운명처럼 춤이 나에게 다가왔다, 로 시작하는 자기소개를 쓸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나에겐 ‘운명’보단 ‘우연’ 쪽에 더 가까웠다.
이제야 돌이켜보니 매주 춤을 추게 되기 전까지는 춤에 관해 관심도 없었고,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었다. 학창 시절 ‘퀵 퀵 퀴카퀵’에 맞춰 발을 몇 번 굴러본 게 다였다. 더 정확히 말하면, ‘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출 수 없는 것’이라고 애당초 못 박아 두었던 것 같다. 대체 누가 그 못을 처음 박기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인지 종종 몇 다리 건너 아는 지인들이 아프리카의 춤을 추거나 본 적이 있는데 참 좋았다, 식의 카더라 통신이 주변에 흥행할 때도 그저 덤덤했을 뿐이다.
‘우연’은 난생처음 가 본 어느 락 페스티벌에서 일어났다. 초저녁에 시작될 공연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뙤약볕 아래 목덜미가 벌겋게 익어가고 있었고, 목덜미를 쓸어보는 대신 차가운 생맥주로 목이나 축이고 있던 참이었다. 어디에선가 곧 아프리카 춤 워크샵이 시작된다는 소리가 들렸다. 딱히 할 일도 없고 궁금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무료라는 말에 솔깃했다. 락 페스티벌까지 제 발로 찾아왔으니 충분히 즐겨보겠다는 마음의 여유도 한몫했다.
잔디밭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북을 두드리고 팔과 다리를 활짝 뻗으며 춤을 추고 있었다. 그들은 소리와 움직임으로 한낮 오후의 무료한 사람들에게 무언의 말을 건네고 있었다. 나는 그저 우연히 그 시간, 그 공간에 있던 사람이었을 뿐인데 난데없이 그들이 건넨 무언의 말에 응답해야 할 것만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둠칫둠칫 두둠칫. 천천히 리듬을 따라 어깨와 엉덩이와 발을 움직이며 나만의 대답을 시작했다. 그들처럼 팔과 다리를 허공으로 쭉쭉 뻗기에는 어쩐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자신감에 찬 춤추는 이들의 표정을 보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겨드랑이를 하늘을 향해 쳐들고 있었다.
연주에 몸을 맡긴 댄서들은 서서히 춤에 흥미를 보이는 이들에게 다가갔다. ‘너 정도면 어쩐지 이 춤판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식의 평가나 ‘어서 너의 뭔가를 보여줘’ 식의 부추김 없이, ‘우리 한 번 신나게 놀아보자’ 같은 손짓이었다. 춤을 한 번도 진지하게 대한 적 없는 나를, 단순히 지켜보는 자가 아닌 움직이는 자로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놀라웠다. 두렵고도 설레고, 낯설면서도 오묘한 시간이 순식간에 흘렀다. 뜨겁게 달아오른 목덜미로 시원한 바람이 스쳤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갔다. 그렇게 쿨레칸을 통해 춤을 만나 여적 춤을 추고 있다.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쓰고 보니 운명 같기도 하다. 아닌가. 하긴 삶이라는 길고도 짧은 여정 속에서 우리가 우연과 운명을 얼마나 구분할 수 있겠는가.
(다음 시간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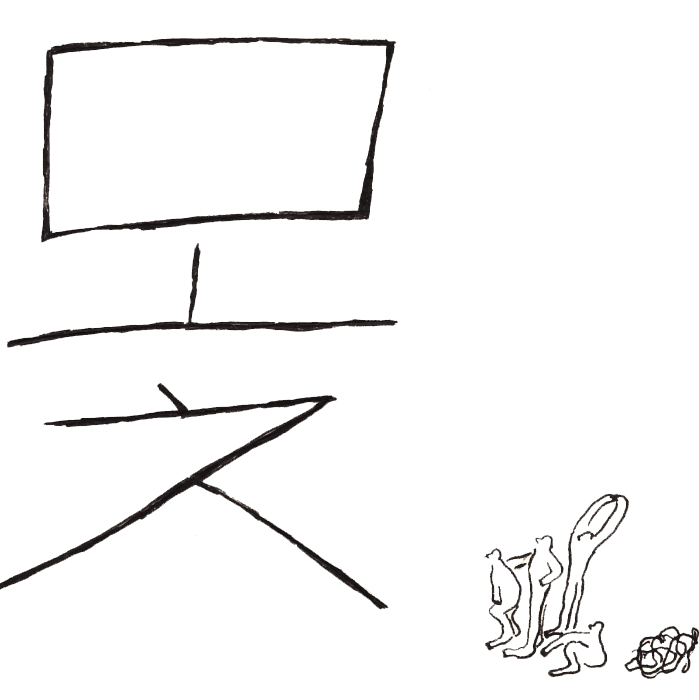



모리
7 years ago다음 시간이 어서 왔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