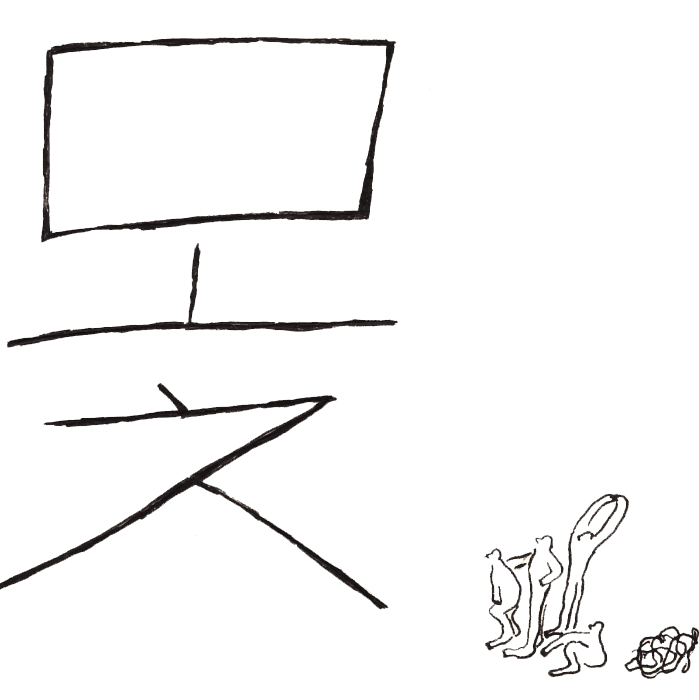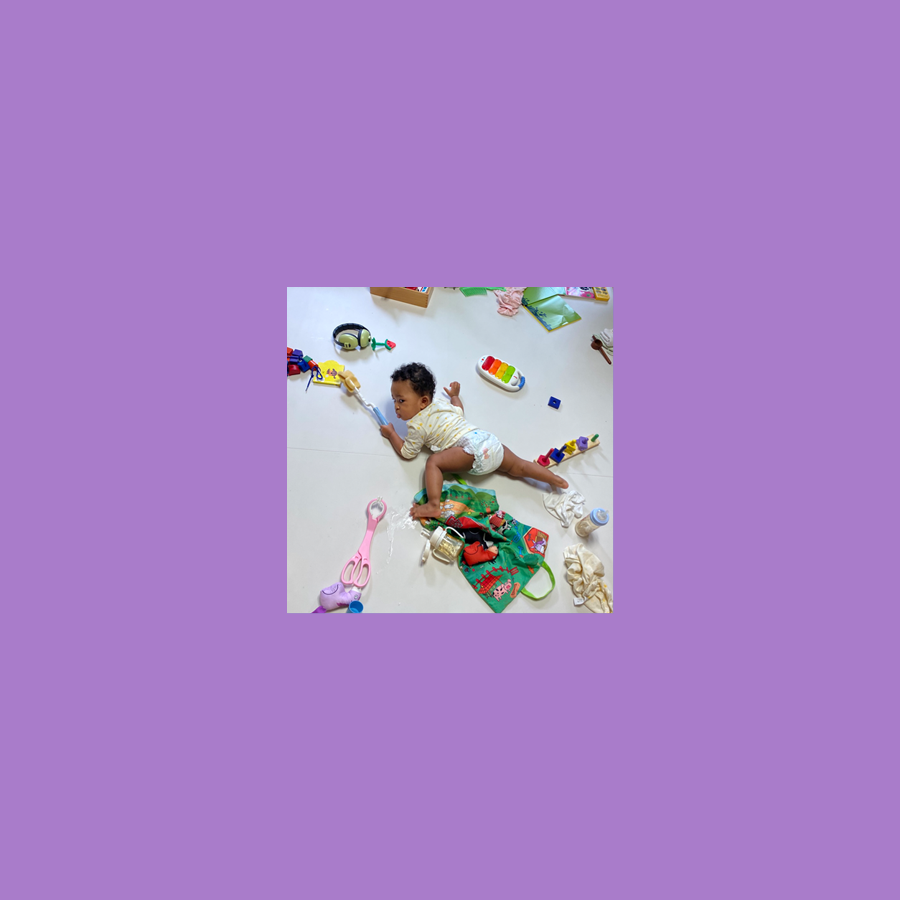16화. 과거의 오늘 – 재난의 시대를 맞이한 우리들의 춤
어느 날 문득 길을 걷다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느낀 적이 언제였더라 질문이 떠올랐다. 이상하게도 생각하면 할수록 가물가물해진다. 오히려 기쁘다, 행복하다고 느낀 순간은 생각보다 많았다. 비 온 뒤 무지개 뜬 하늘이, 마음을 쏟아 부르던 누군가의 노래가, 친구가 깜짝 건넨 손으로 만든 선물이 아름답다고 생각한 순간은 있었으나, 인생이 아름답다라… 적어도 나에게는 꽤나 오래된 이야기였다.
살 만하네, 견딜 만하군, 이것도 나름 좋네, 다행이야 등이 코로나가 시작한 작년부터 올해까지 내가 주로 느낀 긍정적인 감상이 아닐까. 물론 임신 이후 오랜 기간 바깥 활동을 조심하게 된 이유도 있겠다. 코로나에 걸린 임산부가 약 2주 동안 수술과 출산, 산후조리 과정을 오롯이 홀로 견뎌야 했던 이야기를 최근 접하고, 나는 가고 싶던 공연도 영화도 여행도 바로 포기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건 우연은 아니다. 8월은 바야흐로 페스티벌의 계절 아니던가. 8월이 되자 페이스북은 ‘과거의 오늘’이라며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이들이 잔뜩 모여, 있는 힘껏 크게 웃고 있는 추억들을 매일 하나둘씩 보여주기 시작했다. 유럽과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코로나가 마치 사라진 것처럼 거리 축제와 버스킹, 음악 캠프 등을 즐기는 사진을 올렸다. 때마침 이번 달 내가 진행하는 업무가 국제교류를 위한 페스티벌 조사였으니, 내 몸뚱아리는 비록 모니터 앞에 있지만 메타버스 속을 헤매듯 축제의 찬란한 광경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최근 아프리카 댄스 캠프를 연 프랑스 친구에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물었다. 친구는 확진자는 여전히 많지만, 백신을 접종했거나 코로나 음성 확인증이 있으면 문화적인 공간에 자유롭게 갈 수 있다고 했다. 작년만 해도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취소되었던 유럽의 많은 공연예술축제들은 올해는 야외와 극장을 열고 예전처럼 축제를 이어갔다.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쓴 사진들이 보였으나, 야외는 훨씬 더 자유로워 보였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백신 접종률이 70%이상인 점도 ‘위드 코로나’가 가능한데에 큰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각각의 나라들이 가진 우선순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다. 뭣이 중헌 것일까!
나는 축제의 힘을 믿는 사람이다. 일 년에 하루 이틀 길지 않아도, 일상의 지난한 굴레를 짧고 굵게 벗겨버리는 그 힘은 다음 해를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지금도 믿는다. 이십대 중반 춘천마임축제에서 만난 당시 예술감독이었던 유진규 마임이스트는 공연을 하러 온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놀려면 골지게 놀아야지! 새벽 5시까지 공연이 이어지는 ‘도깨비 난장’ 프로그램의 개막을 알리며, 그는 무대 위에서 뱃속 깊은 소리를 끌어내 함성을 내질렀다. 온몸을 진동시키는 그 외침에 자동적으로 일상 모드가 툭하고 꺼졌다.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얼씨구나 손잡고 춤추며 노래하던 사이, 어느새 날이 밝아 저 멀리 소양강 너머로 발간 해가 떠올랐다. 그제서야 발바닥이며 무릎이며 온 삭신이 쑤시며 피곤함이 집채처럼 몰려오는데, 나와 친구는 아침 해를 함께 바라보며 힘 빠진 얼굴로 웃기 시작했다.
그때 든 생각은 이랬다. 잘~ 놀았다! 일이 년은 거뜬히 살 수 있겠어. 이래서 고대부터 인간은 축제를 만들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걸까. 온몸의 힘은 몽땅 빠져버렸으나, 마치 배불리 먹은 사람처럼 이상하게 흐뭇했다. 그때 바라본 소양강의 아침이, 펄떡펄떡 살아있는 이 순간이, 지금 내 인생이 참 아름다워 보였다. 돈 있고 여유 있어야만 가능한 게 아니었다. ‘잘 논다’는 건 한국에서는 한량이거나 부자이거나 진지한 인생을 살지 않는 사람들의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 반대의 상황일 때, 놀이의 힘은 훨씬 커진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혼자서도 느낄 수 없는, 게다가 책으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다. 이 경험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흔드는 첫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 만난 축제들 중엔 무늬만 축제인 곳도 많았다. 비즈니스, 경쟁, 보여주기식의 행사들이 그랬다. 이름에 축제란 말은 없었으나, 축제를 느끼게 하는 파티와 잔치들도 있었다. 이 글을 기회 삼아 내가 언제 ‘축제’를 느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거기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고, 목적 없이 순수한 재미와 자유가 있었고, 기꺼이 나눠주는 감각이 있었고, 기깔나게 음악을 연주하는 이들과 모두가 파도처럼 출렁이는 춤이 있었다.
서로 돕는 사람 없이 축제는 만들어지지 않고,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으로 축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더군다나 음악과 춤이 없다면 그건 축제가 아니다. 홀로 골똘히 컴퓨터에 앉아 만드는 음악도 아니요, 칼군무로 관중들을 우와~하게 만드는 춤도 아니요, 돌고 도는 인생의 리듬을 조금이라도 먼저 이해한 자들이 멋들어지게 안내하는 커다란 소용돌이, 때로는 광란의 블랙홀이 바로 축제의 음악과 춤일 것이다.
이렇게 축제를 예찬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건, 최첨단 기술을 이끌고 있는 한국이 모든 것을 언택트의 세계로 데려가 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서다. 여전히 거리는 조용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파티에서 시끌시끌하게 음악을 울리고, 춤을 추며 ‘골지게’ 놀았던 날들을 잊지 말자고, 그리고 계속 어린이들에게도 이어주자고 말하고 싶다. 축제는 줌도, 메타버스도, 가상현실로도 구현할 수 없는 세계라고. 몸들이 만들고, 몸으로 느끼는 가장 원시적인 공동체라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우리에게 인생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해줄 거라고.
글 | 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