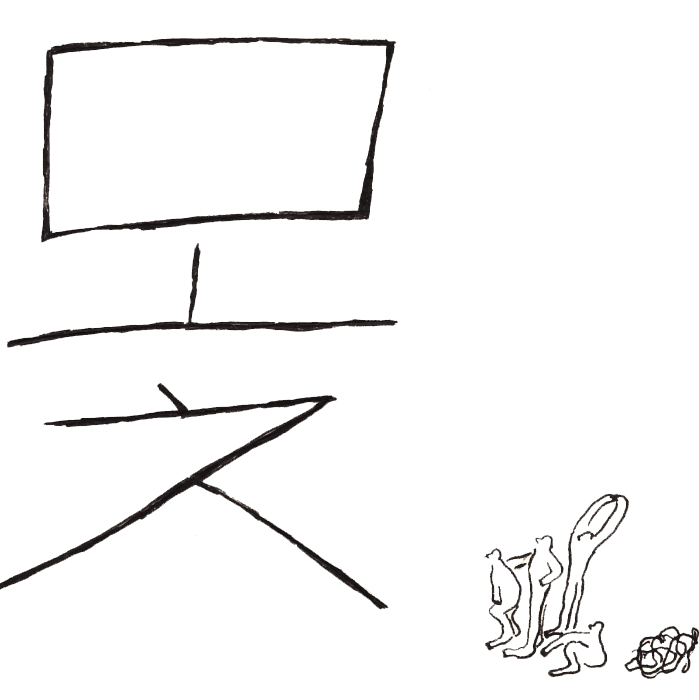13화. 춤추는 여자의 몸 – 보코의 춤추며 그러모은 문장들
오랜 시간 동안 내 몸은 나 자신이기 이전에 비교의 대상이었다. 현대 미술 작가 바바라 크루거(Barbara Kruger)는 1989년 이런 제목의 작품을 만들었다. “당신의 몸은 전쟁터다(Your body is a battleground).” 미국 워싱턴 D.C에서 벌어진 여성들의 낙태법 철회 시위를 지지하며 만든 작품이라고 한다. 이 구호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성의 자궁을 국민 재생산 공장으로 취급하며 저출산 정책을 설계하는 정부와 외모 평가와 힐난이 일상적인 한국 사회에 여전히 유효한 메세지를 던진다. 지금 나의 몸은 무슨 전투를 치르고 있는가. 내 몸에 대한 타인의 말 중 최초의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 역시 평가의 언어다.
“얘는 참 허리도 잘록하니 상체는 봐줄 만한데. 다리랑 엉덩이가 터질 것 같아. 저것만 빼면 좋을 텐데.”
내 몸이 타인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하기 시작하던 유년 시절. 놀랍게도 이 말은 내 곁에서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의 입에서 나왔다. 그래서 한 치의 의심 없이 믿었다. 나는 남들보다 하체가 뚱뚱하구나. 그건 옳지 않거나, 적어도 좋은 건 아니구나. 문장 구조 또한 완벽하지 않나. 장점 칭찬(잘록한 허리와 봐줄 만한 상체)─문제점 지적(터질 것 같은 다리와 엉덩이 살)─해결책 제시(그것을 빼라)까지. 슬프게도 이 세 문장이 내 몸에 대한 첫인상이다. 첫인상은 힘이 셌고 무엇보다 지속력이 뛰어났다. 나는 오래도록 완벽한 이 세 문장에 사로잡혀 있었다. 불완전한 몸에 대한 비뚤어진 감각 위에 불만과 자책이 찐득하게 달라붙었다.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여성의 몸(풍성한 가슴, 잘록한 허리, 늘씬한 다리)과 나의 몸을 수시로 비교했다. 비교는 곁눈질 한 번이면 충분하므로 언제 어디서든 가능했다. 친구들과 수업을 듣다가도,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버스 안에서, 수영장에서, 목욕탕에서, 언제 어디서든 내 눈에 가장 매끄럽고 부러운 다리를 가진 이를 찾아냈다. 주인공의 다리와 내 다리를 번갈아 본 후, 한숨을 지었다. 이 짓을 20년 넘도록 해왔다.
내가 속한 사회가 여성의 몸을 어떤 관점으로 다루는지 보고, 읽고, 들으면서, 함께 분노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만나면서, 서서히 비교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운 좋게 내 몸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동료와 벗을 만난 것도 큰 계기 중 하나였다. 그동안 내 몸을 억압한 주체가 타인과 사회 이전에 나 자신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부터는 늘씬한 다리의 주인공을 찾는 일을 그만뒀다. 타인의 몸에 시선을 거두자 그사이 생긴 공백은 나에 대한 관심으로 채워졌다. 내 몸이 어떤 상태일 때 안정감을 느끼는지, 어떤 욕구를 가졌는지, 비로소 들여다볼 여력이 생긴 것이다. 브라를 벗고 겨드랑이털 관리를 멈췄다. 조금은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졌다. 하지만 단순히 비교를 멈췄다고 해서, 내 몸이 나의 의지로 온전히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었다. 노브라와 겨털이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는 차고도 넘쳤다. 여러 해 동안 방치해 둔 몸이 나이를 먹으며 이런저런 신호를 보냈다. 발목과 허리를 자주 삐끗했다. 지옥 같은 생리통은 매월 인정사정없는 빚쟁이처럼 들이닥쳤다. 내 몸은 나 자체이면서 동시에 나의 것이 아니었다. 한동안 이런 부조화가 지속되었다.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몸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다. 춤을 제대로 느끼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더 정면으로 부딪쳐야만 했다. 무대 위의 춤, 거리의 공연은 관객의 시선을 전제로 한다. 퍼포먼스에 작게 참여하면서부터는 나의 움직임이 어떻게 느껴질지, 무엇이 전달될 수 있을지 타인의 시선을 염두에 뒀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나는 다시 춤을 잘 추는 몸과 그렇지 못한 나의 몸을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 20년처럼 불만과 자책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대했던 것만큼 춤추는 행위가 곧장 몸의 해방으로 연결되진 않았다. 도리어 시시각각 불완전한 몸을 상기시킬 뿐이었다.
춤추는 동안 몸은 아주 서서히 변화했다. 몇 년에 걸쳐 반복해 온 안무가 익숙하게 느껴질 때쯤, 움직임에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덧댈 수 있었다. 내 몸은 무엇이든 될 수 있었다. 나는 태양이 되었다가, 파도가 되었다가, 어둠이 되었다. 몸은 크게 부풀어 이곳저곳을 넘실거리다가 한구석에서 웅숭깊게 작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감각을 느끼는 날은 매우 드물었다. 거기까지 가는 건 너무 오래 걸리고 지난한 일이기도 했다. 춤추는 건 실패를 반복하는 일이 아닐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몸의 속도와 상관없이 제멋대로 질주해버린 자아가 자꾸만 튀어나오려 했다. 나는 이런 사람 아니야.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어. 몸을 움직여 표현하는 대신, 말로 판단하고 해명하고 싶어진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도 마찬가지다. 춤을 춤으로 전하면 될 일을, 이렇게 모니터 앞에 앉아 타다다 문장을 적고 있지 않은가.?
춤을 추면서 이따금 생각이 몸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생각은 저 멀리 어딘가를 더듬거리고 있는데, 춤추는 몸은 현재를 가리킨다. 정처 없이 뻗어간 생각의 가지를 거두고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온다. 판단하길 멈춘다. 비대해진 에고를 꾹꾹 집어넣는다. 숨을 쉬고 느끼고 반응하는 몸,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지닌 본능과 욕구를 투명하게 마주한다. 불완전한 몸.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몸. 나이 들고 아픈 몸. 부드럽고 약한 몸. 욕망의 주체인 몸. 춤추는 여자의 몸은 오늘도 ‘시끄러운 전쟁터(<춤추는 여자는 위험하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