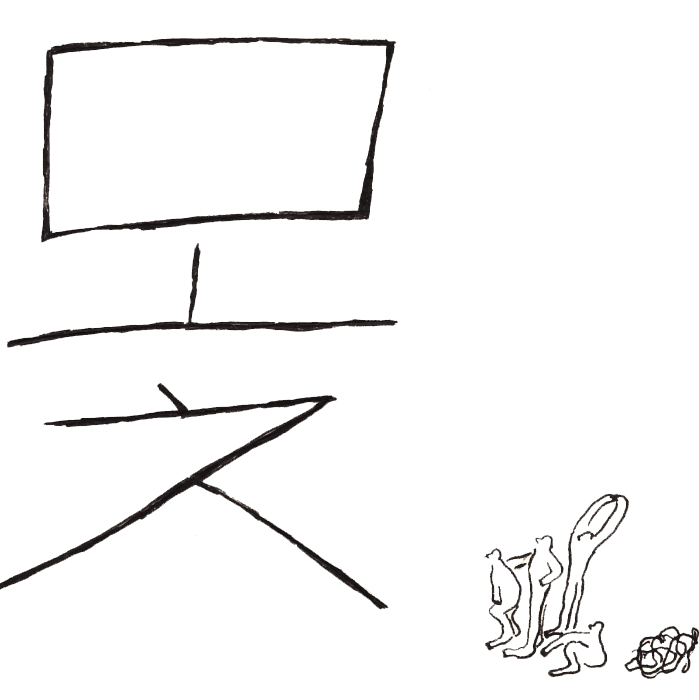0화. 연재를 시작하며 – 춤추며 탐구한 문장들
매월 마지막 주가 되면 궁둥이를 꼭 붙이고 책상 앞에 앉는다. 의식의 중심에 ‘춤’이라는 단어를 둔다. 연필로 빈 종이에 연상되는 문장을 적어본다. 마침표보다는 물음표나 말줄임표로 끝나는 문장이 깨작깨작 이어진다. 물론 완성되지 않은 문장이 태반이고. 수첩과 휴대폰 메모장을 이리저리 헤쳐본다. 한 달 동안 춤을 추고 춤의 영역에 가까이 있는 이들을 만나며, 무엇이 지나갔고 다가왔는지 헤아린다. 춤에 대한 대화, 춤추던 때의 감각, 인상, 느낌, 무의식, 고민 등을 조각조각 오려서 다시 이어 붙인다. 춤에 관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꼽아보라면 아무래도 회상하는 능력 같다. 얼마나 오랫동안 집중해서 몸과 정신에 남아 있던 잔상을 글을 쓰는 현재로 고스란히 불러올 것인가. 그래서인지 대체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시간보다는 모니터 화면이나 빈 종이를 노려보는 시간이 더 길다. 그러니까 궁둥이를 꼭 붙이고 앉아서 주로 하는 일은 끙끙대는 것이다.?
내 안에는 분명한 것과 어렴풋한 것과 미지의 것이 한데 마구 섞여 있다. 썼다 지웠다 하면서 그것들을 천천히 체에 거른다. 앞뒤로 왔다 갔다 밀고 당기고 공중을 향해 톡톡 띄워 보기도 한다. 무언가 남긴 했는데 걸러진 것이 껍질인지 알맹이인지 알 수 없을 때, 언어라는 그릇이 춤추는 행위자의 내면을 적확하게 담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을 때, 가장 의지하는 것은 한국어 사전이다. 손에 잡히지 않는 막막한 마음이 앞설 때 역시 사전을 들락날락거린다.
춤에 관한 글을 쓰는 행위는 새로운 상상을 부리기보단, 흩어진 것을 정성껏 공들여 최대한 비슷한 모습으로 복원하는 작업에 가깝다. 조각들이 빠른 속도로 마모되거나 손상되기 전에 알맞게 붙이려면 깔끔하고도 강력한 접착제가 중요하다. 이어 붙이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사전 속에 있다. 그곳에는 내가 택할 수 있는 모든 단어가 깔끔하고 강력한 모습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기울거나 모자람 없는 표현을 찾아 언어의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어설픈 과장, 달뜬 열기, 글 쓰는 자신에 대한 의구심 같은 불순물도 함께 걸러진다. 몇 번을 반복한 후, 겨우 작은 콩만한 크기의 진실이 체의 거름망 위를 또르르 굴러간다. 그렇게 며칠을 끙끙대고 나면 몿진에 실릴 원고 몇 편이 완성된다. 그 사실을 과거의 나를 통해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의 나는 미래의 내가 몹시 부러울 따름이다.?
춤이 뭐라고. 춤에 관한 글은 또 뭐라고. 누가 등 떠민 적도 없는데 왜 이 고생을 사서 하는 걸까. 몿진이 발행된 지 어언 2년이 흘렀고, 발행의 시작과 함께 나는 매월 ‘춤추며 그러모은 문장들’과 ‘춤 인터뷰’를 기록해왔다. ‘춤추며 그러모은 문장들’에서는 문자 그대로 춤추며 몸과 정신에 모인 문장들을 두서없이 글로 풀었다. 몸의 속도와 정신의 속도가 엎치락뒤치락하는 나날이었다. ‘춤 인터뷰’에서는 나보다 먼저 춤을 경험한 이들을 찾아갔다. 춤을 한복판에 두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그들의 말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막 새로운 연재를 시작할 참이다.?
매월 마감해야 하는 글이 한편 더 늘어난다는 무게감으로 주절주절 길어졌지만, 몿진은 누가 뭐래도 내가 재밌어서 하는 작업이 분명하다. 동시에 내가 필요해서 하는 일이기도 하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연재로 재미와 필요를 확장해보려 한다. 그러니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겠다는 것인데… 미래의 나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현재의 나를 탓할지도 모르겠다. 반드시 두 마리를 꼭 동시에 잡아야 했던 걸까. 대체 누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라는 관용어를 만든 걸까, 이 표현은 과연 정의로운가, 멈칫멈칫 하면서.
새로운 연재의 이름은 ‘춤추며 탐구한 문장들’이다. 춤이 열어젖힌 세계에 관해 ‘문장’에 방점을 찍고 본격적으로 탐구해보기로 했다. 사전을 들락거리던 습관이 이렇게 새 시도를 추동하게 될 줄은 몰랐다. 춤추며 한 뼘 확장된 세계에 머무는 말에는 늘 공동체의 관습적 시선과 관점, 태도가 녹아 있었다. 글보다는 말, 학술적 개념어보다는 일상에서 주로 쓰이는 관용어가 주인공이 될 것 같다. 주춤주춤 물러서다가 쭈뼛쭈뼛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려고 결심하는 순간, 자아의 세계도 춤의 세계도 공동체의 세계도 순식간에 다른 자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 믿음을 앞세워 더 오래 궁둥이를 꼭 붙이고 끙끙대어 보기로 한다. 이 글을 쓰면서 두 가지 단어를 찾아봤다. 앉으면 바닥에 닿는 볼기의 아랫부분은 ‘궁둥이’라고 한다. 엉덩이는 볼기의 윗부분으로 바닥에 닿지 않는다고. 그리고 ‘끙끙대다’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일이나 생각을 해내려고 몹시 애쓰다’ 이다. 바닥에 닿은 궁둥이로 애써보겠다.?
글쓴이 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