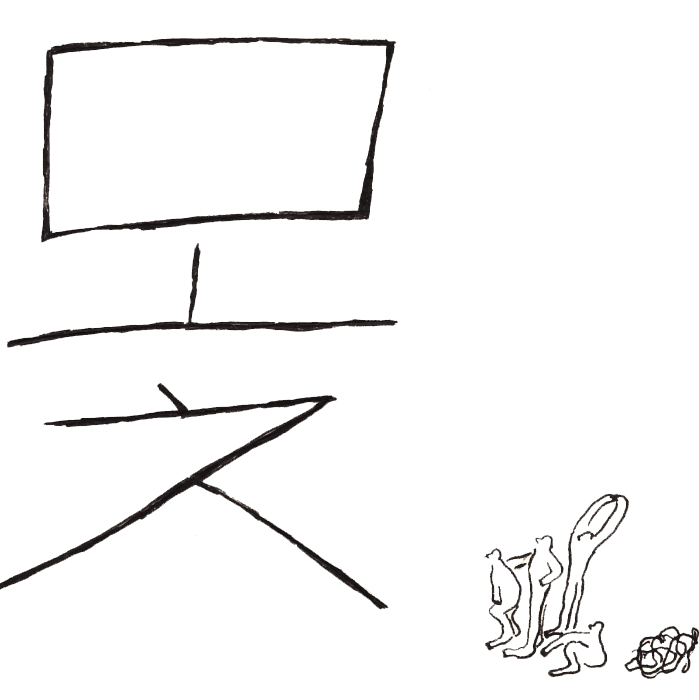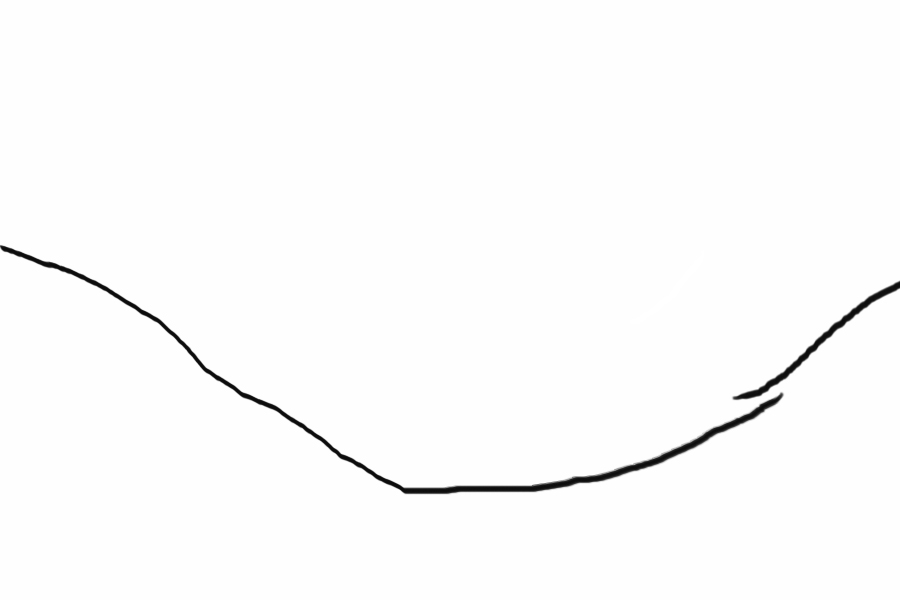
17화. 도달하지 않은 시간의 너머 – 보코의 춤추며 그러모은 문장들
17화. 도달하지 않은 시간의 너머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는 걸 몸일까 의식일까. 감정과 감각의 경계는 얼마만큼 모호하고 또 어느 정도로 선명할까. 시시각각 달라지지 않는 건 나일까 춤일까 춤을 추는 나일까. 이런 의문들은 다 무슨 소용이 있는 걸까. 춤추러 가는 길, 춤추고 난 직후, 춤추지 않는 시간 동안 ‘몿진’을 의식하며 적은 춤에 관한 메모가 쌓여갈수록 의문만 늘었다.
무궁무진해진 물음을 품고 춤 인터뷰를 하러 가는 날은 그나마 발걸음이 가볍다. 내가 가진 물음을 매끈하게 다듬어 적절한 때에 던지고 귀를 쫑긋 세워 누군가가 더듬더듬 만져본 답을 경청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들의 춤과 삶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번호 인터뷰이의 표현에 따르면 오역하지 않도록) 날을 곤두세워 기록하고 정돈하는 일은 일단 마감을 앞둔 미래의 나에게 맡겨두면 되니까.
하지만 ‘춤추며 그러모은 문장들’ 이 코너를 쓰기 위해 텅 빈 화면을 마주할 때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든다. 춤을 추는 동안 느꼈던 감정, 몸의 감각, 타인과의 접촉, 시공간에 묘하게 흐르는 에너지들은 아주 미세한 축에 속하는 것들인데 춤을 추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테지만 한 번 감지하게 된 이상, 모른 척하기 쉽지 않다. 부정하고 싶은 나의 모습도 들춰본다. 그때 느꼈던 불편함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었을까. 춤추던 나일까. 춤추던 그일까. 춤추던 우리의 접촉일까. 이도 저도 아니면 늘 불완전했던 나의 움직임과 미숙한 춤의 세계 때문일까.
모두가 자신만의 춤이 있다고 했는데, 나만의 춤에 확신이 서는 날이 오긴 할까. 몸의 언어, 움직임의 언어 앞에 나는 이제 막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갓난쟁이나 다름없다. 하나의 동작과 안무를 거듭해 연습해도 실수를 연발하거나 마음처럼 잘 표현되지 않는 날에는 몸이 잔뜩 움츠러든다. 나는 입으로 터져 나오는 말의 언어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춤을 만나기 전까지. 그렇다고 춤이라는 언어가 조금은 친숙해졌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은 주제에 아주 할 말만 많은 상태다. (순전히 내 기준에) 큰 무대에 오른 뒤로는 자꾸만 튀어나오는 에고를 붙잡는 것 역시 어렵게 느껴진다. 몸의 언어로 표현하는 데에 실패한 날에는 나도 모르게 한층 긴장이 더해진다. 그 몸을 잘 다독여 밥도 짓고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해야 하니까. 그래도 자신 없다 싶은 날에는 길을 걷다가 갑자기 물에 빠져 입만 동동 수면 위로 띄운 행인 행세를 하며 몸 대신 입으로 절박하게 주절주절 변명하고 싶다. 아, 저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는데요.
춤을 추면 출수록, 공연을 보면 볼수록, 춤이 뭔지 모르겠다 싶은 날도 있다. 그럴 땐 어디 높은 곳에라도 올라가 두 손을 모으고 힘차게 외치고 싶다. ‘몿진’을 단 한 번이라도 읽어본 독자님들, 잠시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나는 이제 춤추는 자에 대한 고민을 그만두기로 하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춤추는 자가 아닙니다. 허공을 향해 커다란 메아리 같은 말을 쏘아 올리고 싶다. 하지만 그리하면 그다음엔, 무엇이 달라질까.
그러니까 춤을 춘다는 것은 어디까지가 내가 인정하고 싶은 나이고 어디까지는 슬그머니 모른 척하고 싶은 나인지 꼿꼿이 지켜보는 일이다.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찰나의 시간을 온몸을 부딪혀 붙잡는 일이다. 그렇게 몸과 의식과 무의식에 변화의 씨앗을 심고서, 시간을 들여 변모하고 싶은 내가 시간을 들여도 절대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믿는 나와 싸워야 하는 일이다. 같지만 단 한 번도 같았던 적 없었던 움직임을 무수히 반복하면서. 시간이 쌓일수록 나아지고 나아가고 있다고 여기다가, 예상치 못한 인생의 각종 사건과 자연스러운 노화, 당연한 부상을 수긍하는 일이다. 한 존재가 자신의 존재감을 한시도 멈추지 않고 마주하는 일이다. 홀로 나를 마주한 힘으로 더불어 살아갈 곁의 다른 존재와 공명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잘 해내야겠다고 다짐했으니 매일 같이 패배감을 맛보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게 아닌가 싶다. 내가 시간을 들여서, 아니 시간이 흘러서 도달한 곳이 그저 여기일 뿐이다. 여기까지 왔다. 더 나아갈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도 나고, 뒤를 마음껏 돌아볼 자유도 나에게 있지만, 다가올 시간이 만들 내가 어떤 모습일지 지금의 나는 절대 알 수가 없다. 가보지 못한 곳, 도달하지 않은 시간의 너머를 떠올려본다. 마지막 고백을 덧붙이자면, 이 문장들은 춤을 추지 않는 동안 잔뜩 웅크려 지내며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