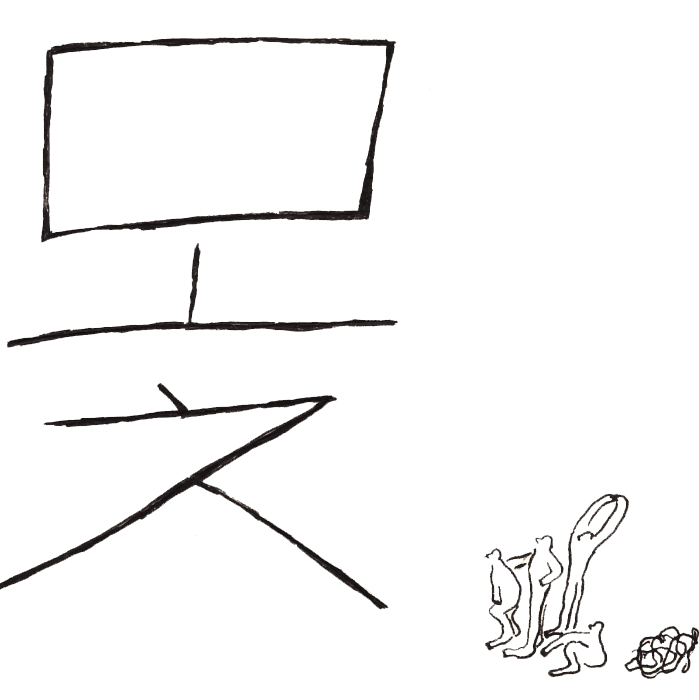[재난의 시대를 맞은 우리들의 춤] 두려웠던 손을 다시 뻗기까지의 시간
마스크를 쓰면 꼭 코로나에게 진 것 같은 억울한 기분이 들던 때가 있었다. 5월쯤이었던가. 지금은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는 10월 말. 매일 신는 양말처럼 쓱-하고 마스크를 쓴다. 지난 3개월동안 이 코너 속에서 나는 내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다른 사람을 인터뷰하거나, 안부를 물었다. 그때는 코로나로 변화된 생활이 ‘뉴노멀’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때였다. 낯설어서 깜짝깜짝 놀랐던 ‘언택트’ 감각에 큰 저항없이 무던해졌다. 지루했다. 감정에 큰 동요가 없었다. 무엇을 쓰고 싶은 욕구도, 이 이야길 꼭 써야한다는 에너지도 없었다. 다른 이들의 일상과 일의 변화, 안부를 물으며 조금씩 힘이 쌓였다. 그리고 지금, 다시 나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 과거를 잠깐 돌아봤더니, 3개월 전인데 참 아득하게 느껴진다. 많은 감각들이 변화했다.
발열체크와 큐알코드 체크인, 손소독을 하고, 빈 좌석을 한 칸씩 띄운 객석에 앉는다. 격자무늬로 절반만 좌석이 있는 공연장에 앉아 곧 시작할 공연을 기다린다. 갑자기 극장 직원분이 다가온다. “마스크 코 위로 올려주세요.” 천으로 된 마스크라 그런지, 또 코 밑으로 내려갔다. 그분이 다시 오셨다. 다시 마스크를 힘껏 올리고, 조심해서 숨을 내쉰다. ‘얼마 만에 극장에서 보는 공연이냐, 그저 감사하기만 하다’ 생각하면서. 암전이 되고, 조명이 밝아지며 공연이 시작됐다. 음악과 노래를 라이브로 듣는 지금이 참 귀하고, 함께 공연을 보는 사람들의 긴장과 눈물과 웃음들이 몸으로 전해지는 게 참 반가웠다. 그러면서도 조심스러웠다. 숨쉬기가, 크게 웃기가, ‘코스크’가. 작아진 숨과 몸만큼 공연도 조심스럽게 내게 와닿았다.
널따란 야외 공간에서 우리 팀이 직접 공연을 하는 날도 있었다. 둥그렇게 관객들이 무대를 둘러싸고, 공연자와 관객들 모두 안전한 거리 속에서 서로를 만날 수 있었다. 잔디와 푸른 하늘이 어우러져,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긴장된 마음이 금세 풀어졌다. 극장 밖을 생각하며 만든 공연이기에, 퍼포머가 관객과 어울리거나 다가가는 안무들이 있었다. 우리는 고민했다. 얼만큼 서로에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까?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결국 공연 중 마스크를 쓰는 파트를 새로이 넣고, 관객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을 택했다.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댄서들의 몸에서 쉴 새 없이 피어오르는 증기, 그리고 마스크를 비집고 뿜어져 나오는 가쁜 숨들. 그리고 표정은 알 수 없지만, 팔과 다리를 빠르게 움직이던 몸짓들이. 입을 가린다고 소리를 지를 수 없는 건 아닌데, 그날 공연만큼은 유독 ‘소리 없는 아우성’이 뒤섞인 몸짓으로 기억이 남아 있다.
또 다른 공연은 무관중으로 공연실황을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을 다양한 영상 채널에서 볼 수 있는 형식이었다. 우리가 몇 달 동안 연습하고 만든 최종 결과물이 ‘공연’이 아니라 ‘영상’이 되는 디지털 공연이었다. 그래서 실제 공연과는 조금 방식을 달리하여 촬영을 했다. 영상을 위해 실제 공연보다 조명을 2~30%씩 더 높이고, 댄서들의 목소리와 발 구르는 소리 등을 잘 녹음하기 위해 핀마이크도 달았다. 40분 공연의 흐름을 끊지 않고 쭉 이어가는 것이 실제 공연에서 중요했는데, 촬영을 할 땐 중간중간 멈추어, 의상과 악기 위치들을 바꾸기도 했다.
환호하는 관객들이 없어 퍼포머들이 공연촬영 도중에 기운이 빠지지 않을까 걱정도 들었다. 당시 공연했던 엠마누엘은 한 명의 관객이라도 있다면 어렵지 않다며, 열 명 남짓의 제작진 역시 우리 공연을 처음 보는 관객이지 않았냐고 물었다. 오히려 힘들었던 건 편집된 영상 속 안무의 흐름이 뚝뚝 끊어지는걸 보는 일이었다고 했다. 이 춤은 이렇게 연결되어야 하고, 이 장면은 클로즈업이 아니라 전체가 보여야 한다는 등의 피드백이었다. 공연을 영상으로 만드는 일은 단순한 촬영편집이 아니라 공연의 감각을 되살리는 일이구나. 영상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클로즈업을 많이 넣으면, 공연 전체 흐름이나 분위기를 이어가는 안무, 조명 등의 변화를 놓칠 수도 있다. 공연의 연출자가 미리 설계했던 흐름을 영상에서도 이어지게 하는 작업이 한 번 더 필요했다.
코로나가 만들어 낸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공연이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걸 보며 신기해도 하고 또 힘을 얻기도 했다. 많은 일들이 ‘언택트’로 진행되기 시작했지만, 공연예술계의 일은 여전히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다. 나는 작게라도 직접 만나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사실 누구를 만나든 감염될 위험이 있지만, 어떤 만남은 그 걱정을 잊게 했다. 내가 언제 마스크를 쓰고 벗는가를 관찰해보니, 내가 어떤 관계까지 안전하게 생각하는지 스스로 알아챌 수 있었다. 사실 아주 비합리적인 행동일 수 있지만, 가족과 가장 가깝게 있다고 해서 마스크를 철두철미하게 쓰고 있다간 먼저 미쳐버렸을지도 모르겠다.
나의 집과 가족, 친한 친구들의 존재는 ‘안전지역’이다. 이 ‘안전지역’에서의 대화와 만남이 지금의 나를 계속 지켜주고 있는 것 같다. 오랫동안 함께 춤춰온 워크숍 멤버들, 공통의 활동을 계속 공유한 사람과도 ‘안전지역’은 만들어진다. 우리의 일이란 게 결국 이 ‘안전지역’을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늘려가는 일이 아닐까 요즘 생각한다. 손을 잡는 일도 그렇다. 낯선 사람의 손을 잡는 건 무서울 수 있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손을 잡으면 힘이 생긴다. 봄에 만났을 땐 손을 잡지 않았던 학생들과 이제는 손을 건네 일으켜 세워주고, 손을 마주한 채 온기를 느낀다. 며칠 전 수업에서 마주했던 한 친구의 손은 무척 따뜻했다. 쭈뼛 날이 서있던 몸들이 스르르하고 풀린다.
글 | 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