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엠마누엘 사누 (2) ‘내 춤은 사회가 어떻게 하면 나아질 것인가 질문하는 방식이다’
이 인터뷰는 지난 호의 인터뷰 <엠마누엘 사누(1) “리듬과 에너지는 내가 원하기 전부터 내 안에 있었다”>와 이어집니다.
나는 2016년, 엠마누엘 미가엘 사누(Emmanuel Migaelle Sanou, 이하 엠마)를 우연히 만나 춤을 배우기 시작했다. 포천 아프리카 박물관 노동 착취 사건의 당사자로 엠마를 호명하던 2014년으로부터 두 해가 멀어져 있었다. 그 사이 엠마는 ‘뿌리의 외침’이라는 뜻을 가진 무용단체 ‘쿨레칸’을 만들었고, 각종 퍼포먼스와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만남이었다. 당시 같은 사건을 겪었던 아프리카 출신의 아티스트 대부분은 결국 한국을 떠났다고 했다. 무엇이 엠마를 다시금 한국에 뿌리내리게 만든 걸까.
내가 포천 박물관 사태를 경험하면서 느낀 건 한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른다는 거야. 당시 나는 미디어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아프리카라는 대륙을 하나의 그룹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랐어. 부르키나파소만 해도 60개가 넘는 민족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들 모두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어?
아프리카에 왔다고 가난하거나 불행했을 거라고 단정 짓거나, 피부색이 다르다고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이들의 태도는 가히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웠다. 엠마는 차별과 고통의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꼿꼿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한국 사회가 규정한 정상이라는 게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은 무엇이지? 21세기에 다름을 이유로 한 부류의 인간이 특정 부류의 인간을 차별하거나 착취하는 일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나의 춤과 안무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계속 한국에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어졌어. 한편으로는 만뎅 문화에서 내가 경험한 풍요로움을 한국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졌고. 만딩고 춤과 예술이 우리의 행복과 슬픔에 어떻게 접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야.

지금은 서아프리카의 만뎅 문화를 기반으로 한 ‘만딩고 춤’이라 칭하지만, 한때는 뭉뚱그려서 ‘아프리카 춤’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엠마와 춤을 추면 출수록 내가 ‘아프리카’ 혹은 ‘춤’이라는 단어에 가지고 있던 인식의 틀이 조금씩 부서졌다. 나의 일상에 아무렇지 않게 자리 잡고 있는 평범하고도 지독한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고 싶다는 욕구도 생겨났다.
사람들은 아프리카 춤이라고 하면 힘이 넘치고 그냥 에너제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냐. 일요일 워크샵을 예로 들면, 우리는 일상적인 움직임을 먼저 탐구하거든. 자연스럽게 몸에 드러나는 것, 매일 하는 움직임 같은 것. 만뎅 문화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미 춤이나 다름없어. 많은 춤은 우리의 삶에서 왔으니까. 그러니 모든 움직임은 춤이 될 수 있고, 꼭 전문적인 무용수가 아니더라도 춤을 출 수 있는 거지.
모든 움직임이 춤이 될 수 있다? 과연 그럴까? 움직임과 춤 사이의 경계는 없는 걸까?
모든 움직임이 춤이 될 수 있다! 일종의 선언처럼 들리기도 한다. 무엇을 향한 선언일까?
자신의 내면과 일상을 달라지게 만들고, 그 변화가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순간. 그때의 움직임이 춤이라고 불릴 수 있겠지. 흔히들 아프리카 춤이 가진 힘과 에너지를 ‘자유’의 정신과 연결 짓곤 하던데. 이 역시 전부가 아니야. 오히려 각자가 가진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끌어내고 전달할 것인가, 이런 질문과 관련이 깊지. 어떻게 에너지를 불러오고, 그 에너지를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움직임이 춤이 되는 거니까. 이건 자유보다는 힘에 가깝다. 우리 내면의 가장 순수한 것을 춤을 통해 꺼내는 힘. 그래서 커다란 써클circle이 중요한 거고.
만뎅 문화에서, 엠마가 이끄는 워크샵에서 늘 커다란 써클, 둥근 원이 있다. 젬베 연주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원을 만든다. 누군가의 동작을 따라 다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원 안에 들어가 모두의 주목을 받으며 자신만의 춤을 추기도 한다. 개별적 존재의 고유성을 존중하면서도 모두가 공동체의 구성원 일부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공유한다.
부르키나파소의 원 안에서 춤은 일상과 가까워. 음악과 춤은 모든 곳에 있고, 또 모두 안에 있다고 믿고.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춤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는 일상과 거리가 멀더라고. 춤은 잘 추는 사람만 출 수 있다든지. 마치 위 아래 위계가 정해진 것처럼. 나의 문화에서 음악과 춤은 위 아래가 아니라 마치 커다란 원big ball과 같아. 그 원 안에 우리 모두가 있을 뿐이야.

몇 년간 엠마와 함께 춤을 춰온 경험으로 어렴풋이 알 것도 같다. 하지만 여전히 만딩고 춤을 낯선 타인에게 설명하는 일은 어렵다. ‘서아프리카’라는 공간적 배경과 ‘만뎅 민족’이라는 문화적 배경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 춤을 한국이라는 현재의 시공간 속에서 내가 췄을 때 발생하는 맥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것. 그 사이 어딘가에 있지만 아직은 나의 언어로 해석하기 어려운 것. 한국에서 계속 작품 활동{<데게베>(2017), <이리코로시기>(2018), <이리바>(2019)}을 이어온 엠마도 나와 같은 질문을 자주 마주했을 것이다. 당신의 무용은 아프리카 전통 무용인가? 현대 무용인가?
글쎄. 같은 춤을 춰도 한국에서는 아프리카 춤이라고 말하겠지만, 부르키나파소에서 추면 현대 무용이라고 불릴걸? 한국에서는 춤을 추는 사람이 아프리카 출신이라서 일 테고. 부르키나파소에서는 내가 추는 춤의 기준이 현대 무용의 특징인 메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통춤이라고 보지 않는 거지. 그럼 대체 현대 무용이 뭘까? 나는 ‘현대적’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컨셉과 전달하고 싶은 메세지, 그리고 그걸 전달하는 자신만의 소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만딩고 춤은 표현과 관련이 깊어. 표정 뿐 아니라 감정, 내면, 바디 리액션body reaction 등을 늘 써클 안에서 공유하니까. 이건 그저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뭘 가지고 보여줄 것인가 하는 이슈와 맞닿아 있어. 어떤 면에서 현대무용 적이기도 하지.

여전히 칼로 무 베듯 딱 시원하진 않다. 그건 엠마의 해석이 질문에서 시작되어서이기도 하다. 그러한 질문은 경험으로부터 왔다. 엠마는 유럽에서 다양한 안무가와 작업을 해왔는데, 당시 유럽에서는 안무가의 출신에 따라 무용의 장르가 정해지는 경우도 빈번했다.
안무가의 국적은 달라도 작업 방식이 동일한 경우도 있단 말이야. 안무가는 주로 컨셉과 메세지를 제시하고 무용수가 자신의 움직임과 테크닉으로 발전시키는 거지. 그럴 때 유럽 출신의 안무가가 아프리카 출신의 무용수와 한 작업은 당연히 현대 무용이라 불리지만, 안무가가 아프리카 출신일 경우에는 보편적인 현대 무용이라 읽히지 않고 아프리카 무용이라 불리는 거지. 둘 다 동작을 발전시킨 건 무용수였는데 말이야.
무용 비전공자로 지식 끈이 짧은 나로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소리다. 혹은 언어와 해석이 현실을 뒤따라오는 속도가 느리다고 치부해버리면 끝나는 문제일까. 모순적인 이 세계에서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걸까?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된다. 우리가 추고 있는 춤, 엠마가 추고 있는 춤은 무엇인가? 엠마의 설명처럼 현대 무용은 개인의 사고와 감정을 중시한다. 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메세지와 컨셉에 집중한다. 그러나 엠마의 퍼포먼스와 작업은 엠마라는 한 개인을 넘어, 우리가 사는 사회와 구조를 향한 시선을 절대 거두지 않는다. 자신의 경험에서 출발해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 인종차별, 페미니즘 등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질문을 춤을 통해 던진다. 엠마에게 다시 물었다. 춤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
지금의 사회는 서로를 배려하기 어려운 시대잖아. 사회적 관계를 움직임에 비유해보자면, 타인의 손을 부드럽게 잡는 게 아니라 확 낚아채는 일이 더 많은 거지. 그럼 아프잖아. 고통받거나 울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 나는 춤이 우리가 어떻게 부드럽게 연결된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터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어. 설사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대할 것인지 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거지. 춤은 몸의 대화body talking이니까. 춤을 통해 내면의 강함, 우리 안의 부드러움, 밝은 면을 끌어내고 또 만들 수 있어.

몸의 대화는 타인과의 연결에 대한 감각을 바꾼다. 엠마의 워크샵에서 일종의 간증(?)이 흔한 이유다. 일요일 워크샵 참여자 중 한 사람은 춤을 추고 난 후 삶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전에는 말투부터 행동까지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공격적인 편이었는데, 춤을 추고 나서는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헤아리는 게 어렵지 않아졌다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타인을 위한 공간이 생긴다.
나는 춤이 단순히 멋진 것,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는 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 적어도 내 춤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 모두가 어떻게 더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질문하는 방식에 가까워.
나는 매주 수요일 ‘쿨레칸 에스쁘아’라는 이름의 커뮤니티 그룹에서 엠마와, 또 다른 이들과 춤을 추고 있다. 한국의 쿨레칸 에스쁘아는 부르키나파소의 쿨레칸과 맥을 같이 한다. 부르키나파소의 쿨레칸은 처음엔 아이들의 춤 워크샵으로 시작했다. 돈이 없지만, 부모가 없지만, 춤을 추고 싶어 하던 아이들을 엠마와 다른 무용수들은 매우 천천히 가르쳤다. 그들 중 일부는 무용수가 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하지만 모두 춤추는 것을 즐기고 작은 규모의 퍼포먼스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엠마는 그들의 성장과 기쁨을 보면서 자신이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확신과 즐거움을 한국에 뿌리내려야겠다고 결심했다. 한국은 이런 기회가 필요해 보이는 사회였으니까.
우리가 사는 곳은 때때로 누군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사회의 기준이나 분위기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 사회가 한계와 경계를 지어버리는 거지. 나는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능력ability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이 믿음에 대한 회복이 필요해 보였어. 무용수가 아닌 이들도 계속 춤을 추고 천천히 다음 단계로 가고, 어느 지점에서 진정으로 잘 해내고 싶은 열망이 생기면 이 마음이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갈 거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자꾸 뒤로만 갈 뿐이야. 이게 내 믿음의 철학이야. If I want to do something, I believe I can and try, I will do.

단순 명료하다. 인제야 춤이라는 영역을 서서히 알아가고 있는 나는 엠마의 안내와 가르침이 버거운 날이 더 많다. 가끔 엠마가 왜 나보다 훨씬 춤을 잘 출 수 있는 이들이 아닌, 매주 똑같은 걸 알려줘도 자꾸만 도돌이표가 되는 나와 같은 이들에게 춤을 가르치고 안무를 짜는지 궁금했다. 제대로 물어볼 겨를이 생기면 입보단 몸을 움직이는 게 시급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질문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그 이유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도 같았다. 전문적인 무용수가 아니었던 나는 ‘누구나 춤을 출 수 있다’는 엠마의 믿음에 기대어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 나의 춤은 과연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으려나.
때가 되면 나는 오랫동안 꾸준히 노력해온 사람들과 큰 퍼포먼스를 만들 계획이야. 와우, 내가 이렇게 춤을 출 수 있구나 느낀 사람들. 마음이 커지고 몸이 달라지고 성장한 사람들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쿨레칸 에스쁘아를 통해 한국 사회에 보여주고 싶어. 일반인과 무용수의 경계 없이. 자신만의 움직임을 찾고 표현할 수 있는 이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답에 가까워질 테니까. 모두가 아티스트가 될 순 없지만, 진정으로 원하고 노력한다면 누군가가 될 수 있어.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근데 자신이 이미 아티스트라고 생각해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노력하지 않고 점프해버리니까. 그럼 무언가를 얻지 못하고 건너뛰어 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안무가 아니라, 완벽하지 않아도 자신을 밀어붙여서 무언가를 꺼낼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말이야.
엠마의 춤은 삶의 철학과 태도가 빚어낸 일종의 믿음처럼 들린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모두는 각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노력하면 나아갈 수 있다. 아무렇게나 툭 내뱉기는 쉽지만, 진심을 다해 전달하기는 어려운 말들. 말 뒤에 숨어있는 가치를 몰라서가 아니다. 믿음이 곧 삶 자체가 되기 어렵다는 걸 알기에 우리는 자주 부정한다. 그런 말을 누가 몰라서 안 하나. 체념하고 회피한다. 나에겐 믿음으로만 머물렀던 문장을 일상에서 부단히 실천하고 구현하는 이를 만날 때 믿음이 가진 힘은 비로소 전해진다. 목소리가 아닌 삶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나는 엠마가 발견한 답을 그저 힐끗 들여다보고 나왔다. 그건 그가 찾은 세계의 믿음이니까. 엠마와의 대화 끝에 나는 나를 향해 제일 먼저 던져야 하는 질문을 찾아냈다.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어떻게 뿌리내릴 것인지 그 몫은 나에게 달려있다. 이 글을 읽고 있을 당신의 질문에도 건투를 빈다.
진행 | 소영, 보코
기록 | 보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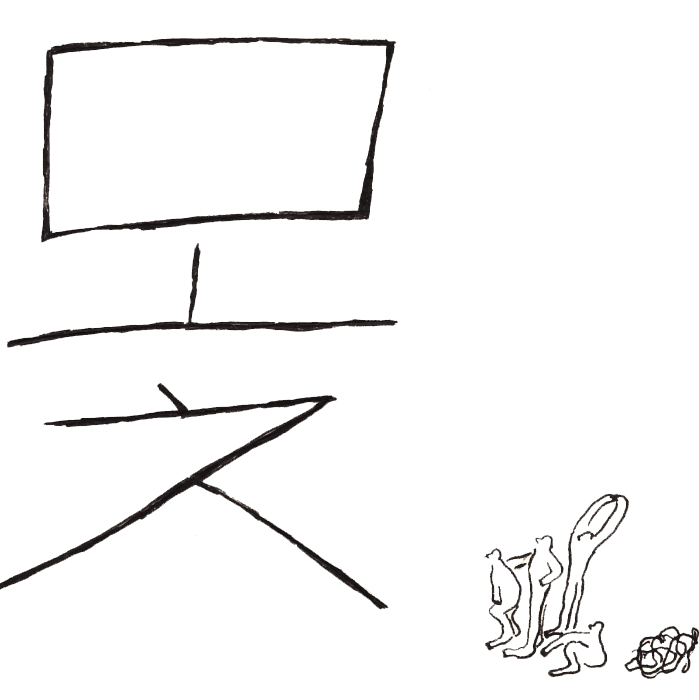



Luna
6 years agoSo wonderful! Someday I also want to particip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