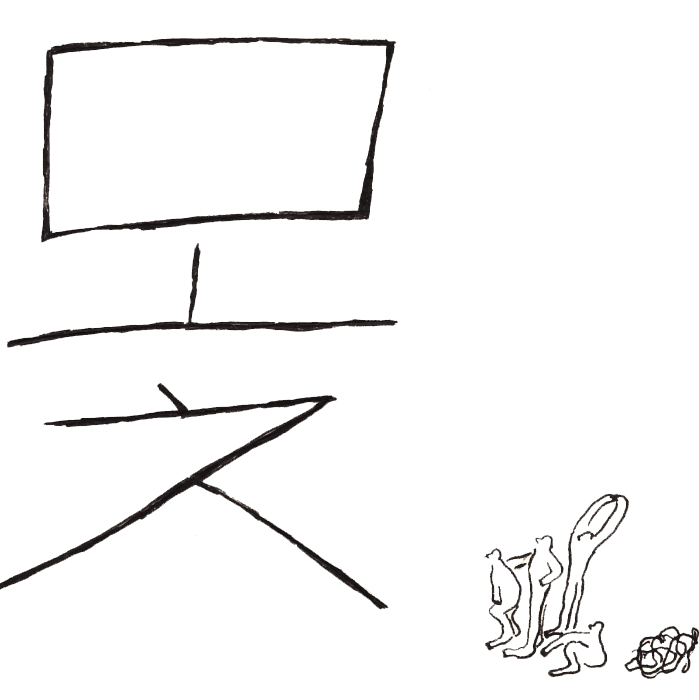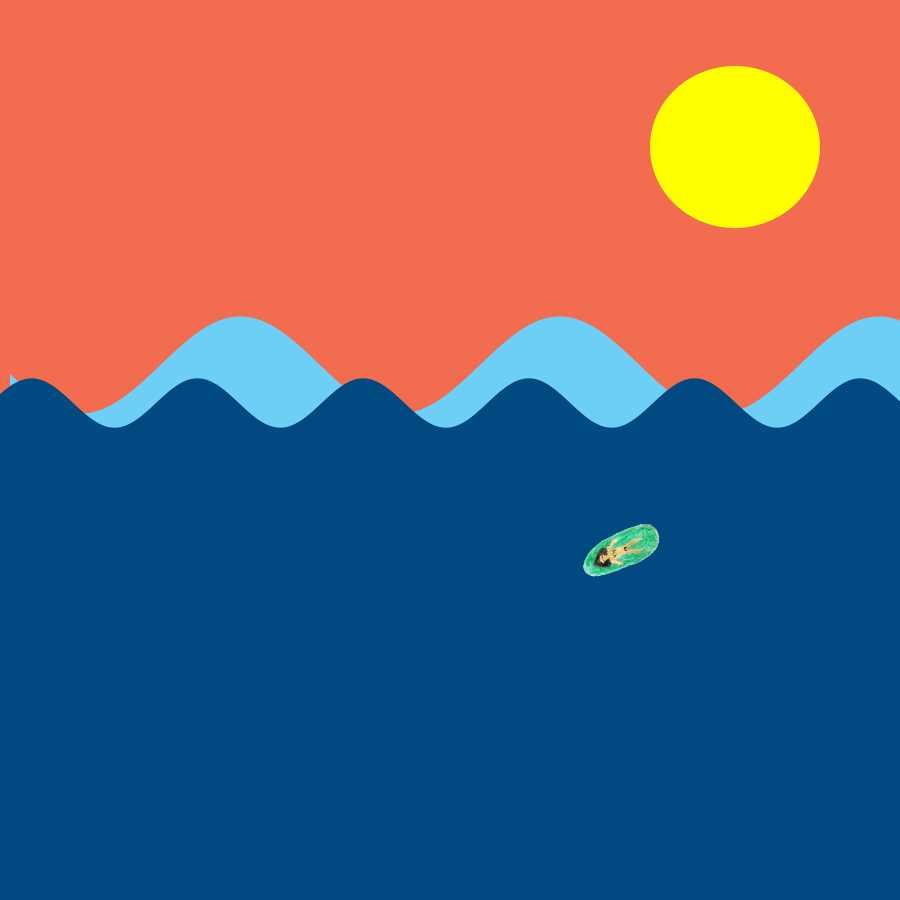
20화. 힘 빼고 – 보코의 춤추며 그러모은 문장들
20화. 힘 빼고
춤을 추면서 안무가에게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힘 빼고’ 이다.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귓가에 선연한 목소리가 울린다. ‘보코, 힘 빼고! 플리즈!’ 무려 느낌표가 두 개나 담긴 목소리다. 처음, 이 목소리가 춤추는 공간에 처음 울려 퍼졌을 때는 아주 부끄러웠다. 정말 ‘플리즈’를 붙일 만큼 심한 상태라는 건가? 내가 평소에 그렇게나 힘을 꽉 주고 살았다니. 다소 당혹스러웠다. 대체 힘을 빼고 의도하는 움직임을 어떻게 만들어 내라는 거지. 그 의미를 온전히 헤아리지 못해 몸은 더욱 버둥댔다. 단순하게는 팔과 다리를 일정한 속도로 뻗는 것부터, 허공을 가르거나 빠른 회전을 반복하는 움직임까지. 나의 몸은 여러 차례 멈칫했다. 정말 놀랄 정도로 몸의 구석구석에 나도 모르는 힘이 실려 있었다.?
생각이 몸에 끼어드는 순간, 긴장은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 오른발 다음 왼발, 왼발이 앞으로 향할 때는 오른손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손과 발의 위치와 속도를 셈하기 시작하면, 뇌의 신호를 처리하지 못한 몸이 일단 굳고 마는 식이다. 게다가 한 번 긴장하기 시작하면 간신히 알아차린 감각도 말짱 도루묵.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도돌이표처럼 움직임을 반복해야만 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춤이라는 움직임을 위해 힘을 빼는 일은 몹시 어렵게만 느껴졌다. 가볍고 부드럽고 간단한 움직임일수록 더더욱.
그렇게 4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간혹 ‘보코, 바로 그거야.’ 같은 말을 듣기도 했다. 4년 전의 나처럼 처음 춤의 세계에 문을 두드리는 이들 중 힘을 빼지 못한 이가 ‘릴랙스, 플리즈’ 같은 말을 들을 때 ‘나는 괜찮은 걸까’ 갸우뚱하면서 춤을 췄다. 일단 멈추지 않고 춤을 추는 게 중요했다. 괴롭지만 기쁘니까. 그러다가 며칠 전 다시 ‘보코! 힘 빼고! 릴랙스!’ 느낌표 세 개가 땅땅 찍혀있는 목소리를 마주했다. 하, 4년 동안 나는 뭘 한 거지. 마침 코로나 19로 춤 워크샵에 참여한 소수의 인원은 오랫동안 함께 춤춰온 친구들이었다. 친구들은 쉬는 시간 다정한 몸짓으로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흠. 왜 안 되는 걸까.’
‘그러니까 보코가 여기에 힘을 주는 것 같은데’
‘아, 아니다. 이렇게 힘이 들어가서인가?’
‘보코야, 그러니까 아예 힘을 빼봐.’
‘그래,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통통 농구공을 튀기듯이 말이야.’
‘응! 응! 그렇게!’
‘아까보다 나아진 것 같지 않아?’
‘음. 아닌가? 그러니까…’
친구들은 머리를 맞대고 자신이 관찰한 나의 움직임에 대해 분석했다. 사뭇 묘한 풍경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뭐가 어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대체 그들은 소화했지만 나는 소화하지 못한 그 차이가 뭔지 우주가 빙빙 도는 만큼 혼란스러울 지경인데, 그들은 되려 차분했다. 침착하고도 면밀하게 자신이 목격한 나의 몸짓에 대해, 내가 답답해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 사려 깊게 말과 몸을 보탰다. 그들이 묘사해주는 내 움직임과 그들이 설명하는 움직임 사이의 간극은 넓었지만, 그들의 몸과 나의 몸 사이는 좁았다. 그러니까 점점 좁혀졌다. 나의 몸짓을 기억하고 관찰하고 모사할 수 있을 만큼 그들과 나의 몸은 가까워진 것이다. 친구들이 흉내 내는 나의 서투른 움직임과 정성을 다해 무슨 감각인지 또렷이 전하려는 그들의 움직임이 허공에서 만났다. 짝, 쿵, 박수를 치는 모양새랑 닮아 있었다. 나는 울고 싶어졌다. 그들의 정성과 정확한 관찰이 고맙고 감동적이었고, 그런 감정을 느낀 내가 여전히 그들과 다른 몸짓으로 움직이는 게 애처로웠기 때문이다. ‘힘 빼고!’라는 나의 춤에 있어서 지상최대의 과제를 푸는 데는 실패했지만 춤만이 가능하게 하는 어떤 시공간을 확인했다. 먼 훗날 정확한 몸짓으로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았던 이 울음을 춤으로 표현하고 싶다. 기쁘지만 애처롭고, 서로 다르지만 그래서 벅차오른 이 순간에 대해서. 춤이 넓혀온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평소 얼마나 ‘힘을 꽉’ 주고 사는지에 대해서.?